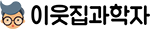비버만 4년을 쫓아다닌 파파라치
파파라치라 하면 연예인들을 쫓아다니며 사진을 찍어 파는 사람들이 떠오르지만 좀 더 전문가 의식이 투철한 파파라치도 존재합니다. 한 파파라치는 원하는 사진을 찍기 위해 4년 동안 물속에서 스노클링 해왔는데요. 드디어 원하는 사진을 건졌다고 합니다.

이 사진은 지난 5월 24일 bioGraphic이라는 사이트에 공유되었습니다. 유럽비버가 포플러 나뭇가지를 입에 물고 수영을 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루아르 지역에서 촬영됐습니다. 어미가 자식에게 먹이를 주기 위해 가는 모습입니다.
겉보기에는 쉽게 찍은 것 같지만 이 사진에 들어간 노력은 다른 사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무려 4년을 매일 같이 강바닥에 엎드려 2-3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찍은 작가는 Louis-Marie Preau인데요. bioGraphic은 Preau 씨와 그의 사진에 대한 간략한 문구를 남겼습니다.
“Preau 씨는 비버의 자연스러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 4년이 걸렸다. 저녁마다 스노클링 장비를 착용하고 강바닥에 엎드려 2~3시간 동안 거의 움직이지도 않았다. 마침내 어느 저녁, 그의 인내가 빛을 발했다. Preau 씨는 자식을 돌보기 위해 포플러 나뭇가지를 물고 오는 비버를 발견하자마자 황급히 몸을 움직여 사진을 촬영했다”

비버를 사랑해주세요
유럽비버는 문명화가 되기 이전에는 굉장히 흔한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세시대부터 시작해 비버를 죽이기 시작했고 비버의 개체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었습니다.
국제자연보호연맹에 따르면 20세기가 시작할 무렵 확인된 유럽비버의 개체 수는 1,200마리에 불과했습니다. 가죽, 모피, 고기를 위해 인간이 죽여왔기 때문이었죠. 심지어 엉덩이 근처의 분비샘은 음식 양념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유럽비버를 보존하려는 노력 덕분에 그 개체 수는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BBC의 2016년 10월 보도를 참조하면 영국은 비버 복원 프로젝트 소기의 성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400년 전 비버가 영국에서 완전히 멸종한 이후, 2009년에 비버를 인위적으로 방사했습니다. 영국 엑서터 대학 생태학 교수 Brazier의 말에 따르면 이 방사 이후 "종다양성이 살아나고 있다"고 하네요.
이처럼 비버는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생물입니다. 뉴멕시코 동물보호청에 따르면 비버가 짓는 댐은 다른 동물들이 의지할 수 있는 습지를 만들어주고 물을 깨끗하게 해주며 침식의 양을 줄여준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