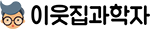금은 인류가 오랫동안 사랑한 물질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인류는 금을 얻기 위해 전쟁을 벌여왔는데요. 금을 계속 채취하기 위해 미생물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희귀한 금속 금, '부의 상징'
화폐를 금으로 바꾸는 금본위제가 폐지된 것은 불과 5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일찍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은 보유한 금이 부족해 전후 복구를 위한 화폐발행이 어려워지자 1931년 금본위제를 폐지했습니다.

이후 미국 또한 베트남 전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달러를 마구 찍어냈고 달러의 가치가 폭락했습니다. 이에 달러를 소유했던 각국이 미국에 금태환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1971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중지를 선언한 이후, 사실상 금본위제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금본위제가 폐지된 이후 금의 값은 더욱 치솟았습니다.
원자번호가 79인 금은 전도율이 높고 부식성이 없습니다. 그런 까닭으로 수천 년이 지나도 부식이 되지 않고 반짝입니다. 금은 어떤 물질에도 화학 변화를 일으키지 않고 녹이 묻지 않아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죠. 다만 금은 화학적으로 불활성을 보여서, 진한 염산과 진한 질산을 3:1로 혼합한 왕수에는 녹는다고 합니다.
인류가 금의 가치를 높게 쳐주는 이유는 매우 희귀한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화성암 1톤당 △철 41kg △구리 55g △은 0.07g 등이 포함된 반면, 금은 0.0011g 정도만이 있습니다.
40~50년 내에 고갈 전망 金 '미생물'이 답?
인류학자들은 금이 기원전 4,000년 전부터 사용됐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19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전세계 금의 총량은 5,000여 t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의 채굴기술이 발달하면서 현재 세계적으로 약 10만여 t이 채굴됐는데요.
문제는 지금 확인된 금의 매장량이 4만여 t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1년 동안 약 1,000t 정도의 금이 채굴되기 때문에 앞으로 40~50년 정도면 더 이상 캐낼 금이 없어지는 것이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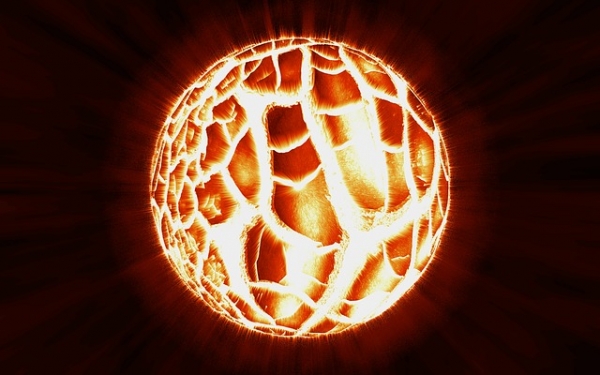
과학자들은 금을 지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안해내는데요. 우선 우주로 나아가 금을 채취해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신성이 폭발할 때 1,000억 도 정도가 되는데, 금은 80억 도 정도만 돼도 합성되므로, 이런 조건들을 찾아 금을 가져오자는 것인데요. 현재 기술로는 우주로 나아가 금을 채취하는 작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백금 등을 고속 이온 충돌기로 충돌시켜 원자핵을 바꾸는 일종의 '연금술'로 금을 만들어내는 과학적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금보다 희귀한 백금을 이용한다는 점에서 효율이 떨어지는 일이죠.
그런데 호주 애들레이드대학 프랭크 리스 박사는 미생물을 이용해 금을 채취하는 기간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에 따르면 '쿠프리아비두스 메탈리두란스'라는 박테리아로 금을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이 박테리아는 독성이 있는 금산화물을 환원해 금 나노 입자를 만든다고 해요. 박테리아가 생존을 위해 독성이 있는 중금속 이온을 자신에게 무해한 금속으로 바꿔 금광을 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쿠프리아비두스 메탈리두란스 200g 정도를 사용하면 원광 1t당 4g의 금을 얻게 됩니다.

또 '페도미크로븀'이라는 세균은 몸 주위에 순금 박막을 형성합니다. 흔히 '사금'이라 불리며 하천에서 발견되는 금의 대부분은 이 세균이 역할을 한 것인데요. 페도미크로븀을 금광산에서 버려진 물에 풀어놓는다면 제한된 매장량에서 추가적인 금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한편, '엑스트레모필'이라는 미생물은 황화물을 분해해 에너지를 얻는데요. 이 미생물은 바다나 온천의 화산분화구 등에 서식하면서 용해된 금 분자를 금 증착물로 변환시킨다고 해요. 생존 조건이 열악한 곳에서 용해된 금속을 금으로 바꾸는 것이죠.
##참고자료##
이종호, <침대에서 읽는 과학>, 서울:북카라반, 2018.